나를 찾아 떠나는 여정
무엇인가 부족함에 항상 갑갑했던 시절. 정작 정확히 무엇이 부족한지 자신의 어설픈 지식과 능력으로 알지 못했다. 청소년 추천 도서에 항상 보이던 헤르만 헤세라는 낯선 이름. 질풍노도의 시절,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에밀 싱클레어의 발견은 나에게 ‘위로’가 되었었다. 미련한 나의 지난날을 추억하며 오래전 읽었던 데미안을 다시 읽게 되었다.
독일 문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헤르만 헤세는 싱클레어라는 평범한 청년의 성장 과정을 통해 이야기를 전개해나간다. 특히 막스 데미안을 스승/친구/인도자로 위기의 순간마다 만나면서 성장하게 되는데, 그는 단순한 인물이 아닌 싱클레어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하다. 나의 어둡던 청소년기를 같이 고민해주는 듯 싱클레어의 생각들은 당시 많은 위로가 되었다. 고전의 장점은 읽을 때마다 다르게 다가온다는 것인데 대표적인 작품이 아닐까 한다.
아, 지금은 알고 있다. 자기에게로 인도하는 길을 걷는 것보다 인간에게 거슬리는 것은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운명과 심성은 하나의 개념에 붙여진 두 개의 이름이다.’
처음엔 그저 호기심이었다. 그래서 책의 내용보다는 모르는 단어들의 뜻을 해석하는데 몰입하곤 했었다.
- 아브락사스
- 조로아스터
- 껍질의 파괴
돌이켜보면 정작 중요한 책의 내용은 제쳐두고 곁가지에만 몰두한 경우라고 하겠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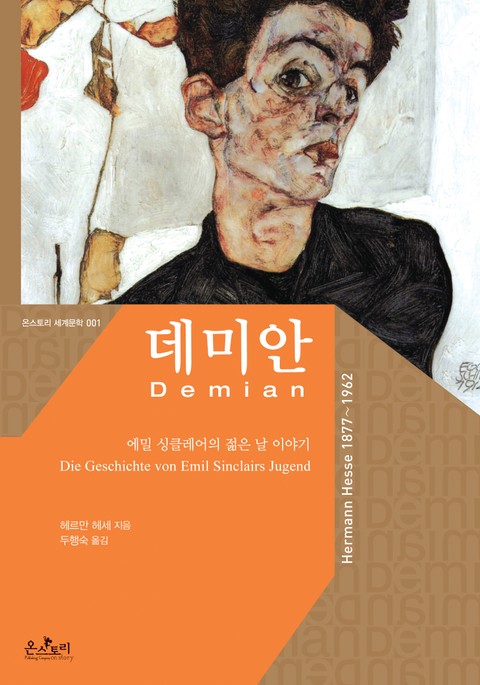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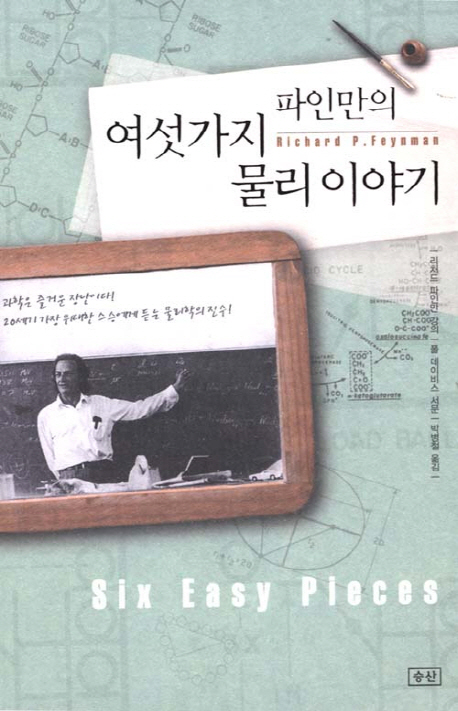


댓글남기기